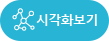| 항목 ID | GC02801613 |
|---|---|
| 한자 | 民謠 |
| 영어음역 | Minnyo| |
| 영어의미역 | Folk Song |
| 분야 | 구비 전승·언어·문학/구비 전승 |
| 유형 | 개념 용어/개념 용어(일반) |
| 지역 | 전라북도 고창군 |
| 시대 | 현대/현대 |
| 집필자 | 김익두 |
[정의]
전라북도 고창 지역의 민중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전해 내려오는 노래.
[개설]
고창 지역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지역의 경계로서, 전라남도권 민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. 민요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. 민요 속에는 그 지방 사람들의 소박한 정서와 생활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향토애가 느껴지는 노래가 많다. 특히 서정적이고도 꾸밈이 없는 소박한 아름다움, 흥겹고 경쾌하며 생동감 있는 가락 등이 특징이다.
[특징]
고창 지역은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지만 해안 지역에서는 어업에도 종사하고 있어서, 농업 노동요와 어업 노동요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. 북쪽에서 부안군 지역까지 내려온 ‘메나리조’ 창법의 요소가 이 지역에서는 더욱 더 약화되고, ‘육자배기조’ 창법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. 다른 전라북도 서부 평야 지역과 같은 ‘교환창’ 노동요는 찾아볼 수 없고, 대부분의 노동요가 ‘선후창’ 노동요로 불리고 있다.
「모심는 소리」의 경우, 전라북도 다른 서부 평야 지역의 「상사 소리」와 함께 전라남도 영광·함평 일대의 「모심는 소리」와 같은 유형의 「상사 소리」가 혼재하고 있다. 후자는 북장단[이를 ‘모방구’ 장단이라 함]이 꼭 들어가고, 곡조가 전라북도의 「자진 상사 소리」 정도로 빨리 진행되며, “아나 농부야 말 들어…….”라는 관용구의 구절이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. 또한 일부 「논매는 소리」의 경우는 한시(漢詩) 구절이 상당이 많이 나타나는 특징도 볼 수 있다.
[제의요]
제의요는 「고사풀이」·「성주풀이」·「액맥이 타령」·「상여 소리」 등이 채록되었다. 고창 지역에서는 「상여 소리」가 가장 많이 채록되고 있다. 이 지역의 「상여 소리」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‘관음보살’이라는 후렴과 ‘어-노 어-노 어-노 어허노’라는 후렴이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공통 표지를 보여주면서, 지역에 따라 다소간의 지역적 변이가 나타난다.
[노동요]
노동요로는 「물푸는 소리」·「모심는 소리」·「논매는 소리」·「장원질 소리」·「벼베는 소리」 등의 도작농업 노동요와, 「그물당기는 소리」 등의 어업 노동요, 그리고 「지경다지는 소리」·「물레질 소리」·「등짐 소리」와 같은 일종의 잡역 노동요 등이 채록되었다.
노동요, 특히 도작 노동요[논일노래] 속에는 지역에 따라 매우 독특하게 발달한 곡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. 또한 이 노동요들은 각 기능에 따른 곡조의 분화가 매우 다양한 특징도 지니고 있다.
예컨대 「모심는 소리」의 경우도 ‘진소리’[느린소리]와 ‘잘룬소리’[빠른소리] 등으로 분화되고, 「논매는 소리」도 ‘진소리’와 ‘잘룬소리’, ‘미도지기’ 등으로 분화된다. 이러한 분화는 모든 고창 지역에서 같거나 유사한 곡조들이 다소간의 변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, 각 지역의 도작 노동요 특히 「논매는 소리」의 곡조는 완전히 다르게 발달하였다. 또한 도작 노동요에는 「물푸는 소리」도 여러 곡 채록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. 이것은 고창 지역이 상당히 높은 구릉성 지형들이 많아, 이러한 지형에서는 논농사를 짓기 위해 수면보다 높은 위치로 물을 품어 올리는 작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필요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.
한편 이 지역의 노동요 중에는 어업 노동요도 상당수가 채록되고 있는데, 그것은 이 지역의 서쪽 사면이 서해 바다와 잇닿아 있기 때문이다. 이 지역의 어업 노동요는 특히 해리면 일대, 그 중에서도 바닷가와 인접해 있는 사반리 미산·작동마을에서 집중적으로 수집되고 있다. 그 중에는 「그물당기는 소리[어기야하 소리]」와 「술배 소리」 등이 있는데, 이 두 가지 노래는 모두 그물을 당길 때 부르는 어업 노동요이다. 전자는 그물을 천천히 당길 때 부르고, 후자는 그물을 좀 더 빨리 당길 때 부른다.
[놀이요]
놀이요로는 「강강수월래」·「애기어르는 노래」·「각설이 타령」·「어름마 타령」·「흥타령」·「산아지 타령」·「똥그랑땡」 등의 민요들이 채록되었다.
특히 이 지역에서 많이 채록된 노래들로는, 각종 동물들에 관한 민요들이 많이 보인다. 「거무 타령」·「꿩타령」·「소타령」·「물메기 타령」·「두꺼비 타령」·「개미 타령」·「말타령」·「새타령」·「사슴 타령」·「이타령」 등등 매우 다양하고 재미있는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다. 각종 동물 및 생활 물품들에 관한 노래들은 그 가사가 상당히 길고 내용이 매우 풍부하게 발달하여 문학적인 흥미를 유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.
[기타]
이 외에도 「강실도령」·「강남땅 강처녀」 등과 같은 서사 민요도 보이고, 「음식타령」·「엿타령」·「담바구 타령」 등 일상생활의 낯익은 사물들을 노래한 민요도 나타난다. 그리고 이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「중타령」·「토끼 타령」·「새타령」·「방아 타령」·「박타령」·「심청가」 등과 같이 판소리와 관련되어 파생된 장편 민요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.
- 김익두, 『전북의 민요』(전북애향운동본부, 1989)
- 김익두, 『전북 노동요』(전북대박물관, 1990)
- 김익두 외, 『한국민요대전』-전라북도편 해설집(문화방송, 1995)
- 박순호, 『고창군구비문학대계』상·하(고창군, 1993)
- 민족문화대백과사전: 민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