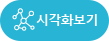| 항목 ID | GC02801628 |
|---|---|
| 한자 | 喪輿- |
| 영어음역 | Sangyeo Sori |
| 영어의미역 | Song of Funeral Procession |
| 이칭/별칭 | 「상부 소리」 |
| 분야 | 구비 전승·언어·문학/구비 전승 |
| 유형 | 작품/민요와 무가 |
| 지역 |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대동리 |
| 집필자 | 김익두 |
| 성격 | 민요|제의요|장례 의식요 |
|---|---|
| 토리 | 육자배기 토리 |
| 기능구분 | 의식요 |
| 형식구분 | 선후창 |
| 가창자/시연자 | 박병노[아산면 대동리] |
[정의]
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대동리에서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의식요.
[개설]
「상여 소리」는 장례 절차 중에서 출상 당일 상여를 메고 출발하기 전이나 상여를 메고 갈 때에 상여꾼이 부르는 장례 의식요이다. 이를 「상부 소리」라고도 한다.
[채록/수집상황]
1993년 박순호가 집필하고 고창군에서 발행한 『고창군구비문학대계』에 실려 있다. 이는 박순호가 1990년 2월 24일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대동리 43번지에 현지 조사를 나가 주민 박병노[남, 68]로부터 채록한 것이다.
[구성 및 형식]
한 사람이 선창하면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후렴 따위를 이어 부르는 선후창 형식의 노래이다. 상여소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. 앞부분은 상여를 메고 출발하기 전에 부르는 노래로, 이 부분의 후렴[받는 소리]은 ‘관음보살’이다. 뒷부분은 상여를 메고 무덤으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로, 이 부분의 후렴은 ‘어-노 어-노 어-노 어-허노’이다.
[내용]
[메]어-어-어허-이허-허 삼천갑자 동방삭이 살았었고 전후 팔십 강태공 살았건만 자식의 인생들은 단 팔십을 못다 사니 이 아니 서러운가/ [받]관음보살/ [메]어-어-어허-이허-허 영리기가 왕정유택 개긴견례 영결존천 떠나시니 아미보살/ [받]관음보살/ [메]어-어-어허-이허-허 화태 시절 번잭이는 약명 몰라 죽었으며 천하 갑부 석숭인들 금전이 묻혀 죽었을까/ [받]관음보살/ [메]에헤-허 에-허이-허 허 황천길이 머다더니 바로 대문 밖으가 황천일래/ [받]관음보살/ [메]에헤-허 에-이-허 허 천리행을 일석지지 인시하관 묘시발복 백자천석 부귀영화지로 찾어가니/ [받]관암보살/ [메]어-노 어-노 어-노 어-허노/ [받]어-노 어-노 어-노 어-허노/ [메]원노로구나 원노로구나 멀 원자 질 노자 원로로구나/ [받]어-노 어-노 어-노 어-허노/ [메]화태시절 변잭이는 약명을 몰라서 고원일까/ [받]어-노 어-노 어-노 어-허노/ [메]명사십리 해당화야 니 꽃 진다고 설워를 마소/ [받]어-노 어-노 어-노 어-허노/ [메]니 꽃일랑은 명년 춘삼월이 오며는 니 꽃일랑은 다시나 피고/ [받]어-노 어-노 어-노 어-허노.
[현황]
「상여 소리」는 농어촌 전통 사회에 아직도 장례 풍속이 남아 있어 다른 민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전승력이 나은 편이다.
[의의와 평가]
고창 지역에서 채록된 대표적인 「상여 소리」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상여 위에 싣고 묘소까지 운구할 때 상두꾼들이 부르는 노래로, 장례 민속을 알 수 있다.
- 김익두, 『전북의 민요』(전북애향운동본부, 1989)
- 김익두, 『전북 노동요』(전북대박물관, 1990)
- 박순호, 『고창군구비문학대계』상·하(고창군, 1993)